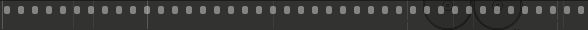
무병(신이 들어서므로 육신과 정신이 온전한 자아를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 걸린 여인 인희에게
무당 이해경이 내림굿을 하는 과정을 현장 추적한 다큐 영화이다.
인희는 무병에 걸려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 무당 해경을 만나게 되고,
무당 해경은 그녀가 이미 겪은 경험을 인용하며 인희에게
'몸 안으로 드는 신을 모셔야만 무병으로부터 놓여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 무병을 거쳐 무당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기설기 크로스 시키면서
인희의 내림굿이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누구할 것 없이 겪어야만 하는 인생의 고통,
삶과 죽음의 교차로에 존재하는 유한적 목숨으로서의 본질적 표류,
이런저런 사연으로 죽음을 맞이하게된 '넋(원혼)들의 자기 변론 또는 한풀이'가 묘사된다.
그리고 신의 심부름꾼으로서 무당들이 굿이라는 행위를 통해
묶인 산자와 죽은 자들 간의 소통의 부재를 해갈한다.
그 속에서 무속인들의 처절한 시달림의 현장이 재현되고 더불어,
보편적인 삶을 중지당하고 현대사회가 터부시하는 한때의 문명을 질머지고 살아야하는
남다른 세계의 사람이 된 그들 무속인의 인간적 애환들이 나타난다.
여과없이,
극적 조작없이,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울음과 웃음, 외침과 절재, 공포와 초월의 끊임없는 교란 .... 그것이 현생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떠난 영혼들과 산 자의 교란이고, 구천을 맴도는 영혼들의 교란이고, 생의 굴레라고
지적하듯 영화의 진행은 끊임없는 원초적 감성과 관객을 만나게 한다.
여과없는 장면들은 생전 처음 접하는 샤만의 상징체계가 보여주는 끔찍함에 소름 돋게 하였고,
무속인이지만 한없이 소박한 한 인간의 눈물 속에서 맨살을 찢은 듯한 통증을 느끼게 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질긴 명줄이란 말인가?
여러번 생명의 잉태와 성장과 성숙과 죽음과 영혼에 대하여 혼란하엿으나,
이 모든 어지러운 기호들을 풀이하기 위한 열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보건데 그 기호들을 풀이할 열쇄는 어느 영화 평론에서 읽은 정신치료의
샤만적 의존이라는 이론적 규정보다는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쉽지 않을까
싶었다.
한반도에서 반만년을 살아온 민족이 지닌 생명력과 질곡.
우리 민족의 천진함과, 우리 민족의 가난함과, 우리 민족의 순박함과, 우리 민족의 연민 가득한
다정함이 곧 이 무속의 모습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
.......아무튼,
영화를 해석해 보려 했으나 해석이 오히려 암호가 되고 말았으니,
이 배배꼬인 문장들을 읽고, 혹시 분통이 터지시는 분들은,
곧, 머지않아, DVD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구해서 보시기를 권한다.
해괴하다고 하기에는 우리 민족의 남루함이 애잔하고 인정스럽다.
원래 무속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
어른이 되도록,
공부했고, 공부하고, 공부하기를 강요 당했고, 강요하면서 살아가는
공부의 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민족 역사의 질곡 속에서,
우리 민중의 방황하는 정신을 보듬고 함께 뒹굴어온 그것 무속에 대하여
(우리 부모네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처절하게 매달렸던 그것)
너무나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한편 우습고,
한편 부끄럽고,
한편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던 터라
영화에 대한 소식을 접하였을 때 망설임 없이 극장으로 향했다.
고상한 종교적 의례를 갖추지 못했고,
체계적 이론으로 정립되어 대중적인 언어로 각색된 뒤에 전파되어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정신적 지침이 되어주지 못한 것이,
그들의 탓인가?
아니면, 서구 문명을 쫓아가기에 급급하여 내 모습을 가다듬을 틈이 없었던
우리 민족의 가난함을 탓해야 하는가?
아니라면 미신에 사로잡힌 우둔한 민중을 계몽하여 근대화의 길로 끌어내기에 전력을 했던
연이은 군사정권의 편견을 탓해야 하는가?
무관심한 나 자신을 탓해야 하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를 집대성할 종교적 천재가 탄생하지 못한 우리민족의 불운인가?
그런 마음이었다.
......
모처럼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다는 여중 동창에게 전화를 받고 영화를 보자고 하니
친구는 '글쎄....'하고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짠돌이인 내가 '가자!'고 강력히 이끌지 않는 편인데(혼자 갈지라도)
'내가 보여줄께!'했다.
함께 보고싶기도 했지만,
한 사람이라도 함께 보아야 모처럼의 시간이 억울하지 않을 듯했다.
이 친구는 무속을 여러번 접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다.
영화 말미에 울어서 눈이 벌개진 내가 '어땠냐?' 했더니 친구는 하품을 하며,
'야, 지루해 죽는 줄 알았다. 다 아는 건데 뭐....' 했다.
이 영화에 대한 나의 느낌은 이 친구와 나의 대화로 요약하고 싶다.
새로운 것을 찾아 동분서주 하는 동안, 내 집이 낯설어진 나와
늘 내 집에서 살았으니 내 집이 지루하고 별 특별할 것도 없는 내 친구의 차이...
이 친구 말이,
'글쎄 특별히 느낌이랄 게 뭐 있냐, 우리 사는 꼬라진데....'(ㅎㅎ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놀라웠고, 나는 아팠지만,
친구는 '원래 사는 게 그래. 뭘 울기까지 하냐.' 했으니까.
무속인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도 '나로서는 안타깝다'고 했지만, 친구는
'그게 그 사람 팔잔데 뭐. 우리도 팔자를 지고 살잖냐.' 했다.
어찌보면 무심함으로 오인될 여지가 다분한 내 친구의 화법은
언제나 내가 다시 번역을 해야만한다.
그녀의 무심함은 무심함이 아니다.
의연함이다.
고달픔을 고달픔으로 견디기보다
의연함으로 견디는 것이 훨씬 견딜만 하고, 살만하고, 생생하다는 것이
그녀가 익혀온 삶을 대하는 태도다.
이것은 물론 내가 읽는 그녀 모습이다.
그런 그 친구는 어쩌면 무당 이해경을 닮았다.
부지런히 살고,
부지런히 놀고,
자신의 앞에 닥쳐온 운명에 대하여 고민없이 받아들인다.
'우야노 내팔잔데. 누가 대신 살아 줄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야지....'
화면에서 만난 그녀 무당 이해경과,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 기록되어진 그녀 무당 이해경과,
내 사색 속의 그녀는,
순명하면서 그러나 정지하지 않는 열정적인 삶을 사는 한 사람의 자연인이다.
순명은 곧 열정적인 삶의 태도라고 말하는 듯,
개척하고,
나아가고,
인정하고,
끌어안는다.
아마도 이런 삶의 태도는 반만년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생을 헤쳐나가는 체화된 생존 비법이 아닐까 ......싶다.

'시향을 창가에두고 > 관심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나름대로 골라 본 10권 (0) | 2007.06.07 |
|---|---|
| [스크랩] 전원주택의 외부 이미지 자료.. (0) | 2007.03.13 |
| [스크랩] 전원주택에 Deck(데크) 꾸미기... (0) | 2007.03.13 |
| [스크랩] 나름대로 고른 11권 (0) | 2007.03.05 |
| [스크랩] 볼만한 책 8권 (0) | 2006.12.20 |
